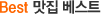| ||||||||
|
||||||||
|
Home > 요리 > 유용한 요리정보 > 최고 맛집을 찾아라 |
|
||||||||||||||||||||||||||||||||||||||||||||||||||||||||||||
|
|
   |
냉면최고의 맛은 어디? | ||
|
||
http://cook.ancamera.co.kr/view.php?category=U0wNNEIrVD9NNA%3D%3D&num=EhlGdw%3D%3D&page=8

|
||
  장인의 귀띔 "비법이 뭐냐고, 정성이야 정성" 올해 71세의 김태원씨. 그의 일과는 매일 오전 6시에 출근해 커다란 솥단지에 육수를 끓이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가 하루에 끓이는 육수의 양은 무려 500리터. 올해로 58년째 단 하루도 쉰 적이 없는 일이다. 벽제외식산업개발의 조리부 실장인 김씨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벽제갈비와 평양냉면 전문점 봉피양의 냉면 요리를 책임지고 있다. 사람들은 그를 직함 대신 장인이라는 호칭으로 부른다. 그의 인생은 냉면과 함께 흘러왔고, 냉면 속에 그의 인생이 있다. 김씨의 냉면 인생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 시작됐다. 충북 청원군 옥산면 출신인 그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징집을 피해 무작정 서울로 도망쳐왔고, 우연히 소개로 취직한 곳이 주교동의 '우래옥'이었다. 평양 출신 주방장의 발치에서 새우잠을 자다가 툭툭 차는 발길에 새벽 4시면 일어나 장작을 피우고 무쇠솥에 육수를 끓였다. 수세미가 없어서 풀뿌리를 말려 냉면 그릇의 기름때를 닦았다.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늘 남아서 불어터진 냉면이었다. 그는 젊은 시절 잠을 푹 잔 적이 없다. 육수를 만들 때는 수시로 불순물을 걷어내야 누린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한시도 불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육수 맛이 달라지면 주인장이 육수가 든 드럼통을 엎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해서 남에게 대신 시킬 수도 없었다. 이렇게 정성을 쏟은 만큼 우래옥의 냉면 인기는 하늘을 찔렀다. 김씨는 "우래옥 냉면이 너무 잘 팔리니까 경쟁 식당이던 서래관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찾아와 싸움이 붙기도 했다"며 웃었다. 김씨는 제대 후인 60년대 중반부터 우래옥의 주방을 책임지게 된다. 특히 1978년 우래옥의 종로 분점으로 옮겼을 때는 하루 20그릇 팔리던 냉면이 400그릇 넘게 팔리면서 본점 보다 손님이 많이 몰리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론은 본점 복귀. 그는 "이승만 대통령 시절 경무대에서 사람들이 나와 내가 만든 냉면을 여러 차례 사간 적이 있다"고 말했다. 80년대 초반에는 유명 요정이었던 대원각 주방장으로 스카우트되어 10여년 일했다. 을지면옥, 평안면옥 등 평양냉면집이 문을 열 때 그가 뒤에서 코치를 해주는 일도 잦았다. 92년 지금의 직장에 자리잡은 뒤부터는 후계자를 키우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그는 "일이 힘들다보니 오래 버티는 젊은이가 많지 않고, 조금만 가르치면 개업을 하겠다고 나간다. 인내심이 부족한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지금껏 한 번도 사장이 된 적이 없다. 늘 주방의 뜨거운 불 앞이 그의 자리였다. 이유를 묻자 그는 "집사람이 장사는 하지 말라고 말렸다"며 웃었다. "사업을 하려면 얼마나 신경쓸 일이 많아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그저 평양냉면 만드는 것 뿐이니 그게 천직이라 생각했어요." 그의 평양냉면은 맑고 담백하다. 달짝지근한 맛에 길들여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밍밍하다고 하기도 한다. 입맛이 바뀌었으니 당연히 음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는 "손님의 입맛에 맞추다가는 본래의 맛을 다 잃어버리고 말 거다. 내가 할 일은 그저 내가 배운 맛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게 육수를 어떻게 만드는지 물어보니 쇠고기, 돼지고기, 노계(老鷄), 감초, 생강, 파, 양파 등 뜻밖에 쉽게 재료 이름들이 흘러나온다. 그렇지만 배합 비율 만큼은 절대 비밀이란다. 대신 "육수를 끓이다 물이 졸면 중간에 육수를 퍼내고 물을 다시 넣어서 끓이는데, 처음 우린 육수와 두 번째 육수를 섞어서 최종 육수를 만든다"는 비법을 살짝 공개했다. 면은 메밀에 감자 전분을 섞어 반죽하지만, 나이 많은 손님들을 위해 순 메밀로 만든 순면을 별도로 준비한다. 김씨는 이날 주방에서 직접 메밀가루 반죽을 했다. 제자가 김이 올라오는 더운 물을 담아오자, 고개를 젓더니 찬 물을 떠오라고 시켰다. "날씨가 더우면 면이 잘 풀어지기 때문에 찬 물로 반죽하는 거예요. 여름에는 메밀 함량을 낮추고 삶는 시간도 줄여요. 반면 겨울에는 삶는 시간을 늘리고, 메밀 함량도 높이지. 겨울철 메밀은 갓 수확해 맛이 좋거든." 김씨는 어느새 면을 뽑고, 삶고, 찬 물에 씻어 건져낸 뒤 곱게 고명을 얹고 육수를 넉넉히 부은 그릇을 내놓는다. 먹음직한 평양냉면을 보고 젓가락부터 드는 성급한 손님을 향해 김씨가 입을 뗐다. "육수부터 먼저 마셔봐요." 미소 띤 그의 얼굴에는 자신의 냉면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다. |
   |
| 총 게시글 1,385개 |
 | EST.1894 | 조회: 7341 |
| est.1894100% 호주산 쇠고기 목등심을 무쇠 로타그릴에 구워 만드는데 고열과 원적외선에 의해 기름기가 속 빠지고 담백함과 촉촉함이 더해져 풍부한 육즙의 맛을 느낄 수 ... | ||
| [ 스리틸걸스 | 2014-03-03 ] | ||
 | TWO BROZ 투브로즈 | 조회: 7102 |
| two broz 투브로즈 나와 햄버거는 형제 라는 뜻을 담고 있는 투브로즈. 연구를 거쳐 탄생한 독특한 번은 부드럽고 쫀득한 질감이 더해져 고기와 채소의 맛을 높여준다. 패티... | ||
| [ 쌈장소녀 | 2014-03-03 ] | ||
 | Gobble n' Go 고블앤고 | 조회: 7276 |
| gobble n go 고블앤고매일 아침 굽는 햄버거 번에 신선한 유기농 채소를 더해 건강에 좋은 햄버거를 만든다. 호주산 쇠고기 목심으로 만든 도톰한 패티와 국내산 닭고기를... | ||
| [ 블랙로즈 | 2014-03-03 ] | ||
 | Paddy's 패디스 | 조회: 8290 |
| paddy s 패디스햄버거 번은 방부제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100% 우리밀을 사용하며, 밀빵과 견과류가 들어간 통밀빵 중 고를 수 있다. 유기농 채소를 사용하며 호... | ||
| [ 하늘 | 2014-03-03 ] | ||
 | PATTY PATTY 패티패티 | 조회: 8404 |
| patty patty 패티패티참나무 그릴에 구운 패티는 참숯의 향이 느껴지며 풍부한 육즙의 맛을 느낄 수 있다. 햄버거는 매일 아침 직접 구운 브리오슈 번을 빵으로 사용하고 ... | ||
| [ ★…믿는 ㉠ㅓ㉧f | 2014-03-03 ] | ||
 | 리츠칼튼, 눈과 혀로 느끼는 봄기운 '딸기 디... | 조회: 9075 |
| [osen=최은주 기자] 혀끝에서 봄이 오는 소식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있어... | ||
| [ 미레아 | 2014-02-24 ] | ||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