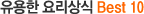|
|
와인잔에도 S라인이 있다 |
| 글쓴이: 어린늑대 | 날짜: 2009-11-10 |
조회: 7736 |
|
|
|
http://cook.ancamera.co.kr/view.php?category=QkYTLUwwVTtNIxs%3D&num=EhtIcxU%3D&page=70

|
포도주 애호가 황지희(30·여)씨는 얼마 전 서울의 특급호텔에서 열린 송년 모임에 참석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행사에 앞서 열린 리셉션에서 볼(bowl)이 넓지만 깊이가 얕은 칵테일 잔에 샴페인을 따라줬기 때문이다. 황씨는 “와인잔을 보면 그 호텔의 수준을 알 수 있다”며 “샴페인 잔은 기포가 증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볼이 좁아야 하고, 미세한 기포가 피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길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연 사실일까.

샴페인은 황씨의 말처럼 볼이 좁고 긴 잔을 사용하는 게 정석이다. 하지만 여성이 많이 모이는 파티에선 납작한 잔을 내놓을 때가 많다. 이는 모임에 참석한 중년 여성을 배려한 조치다. 긴 잔에 담긴 샴페인을 마시려면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젖혀야 한다. 이때 감춰져 있던 목의 주름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어떤 화장도 목에 새겨진 세월의 깊이만큼은 감출 수 없는 노릇. 반면 납작한 잔은 고개를 젖히지 않고 잔 끝만 살짝 올려도 마실 수 있다. 이 잔은 프랑스 루이 16세의 아내로 단두대에서 처형된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게 속설 중 하나다. 생전 샴페인을 사랑했던 왕비는 궁중 파티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가슴 모양을 본뜬 잔을 내놓으라고 지시했다는 후문이다.
와인만큼 ‘장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곳도 없다. 고수뿐 아니라 초보자들도 일단 와인을 마시기 시작하면 근사한 와인잔에 눈이 가게 마련이다. 하지만 와인잔 모양이 다양한 것은 디자인 때문만이 아니다. 와인잔엔 와인 못지않게 깊은 역사와 과학이 담겨 있다. 네이버에서 와인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정휘웅씨는 “잔에 따라 와인의 맛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며 “저렴한 와인도 좋은 잔으로 마실 때는 훨씬 다양한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와인잔의 길이는 와인이 혀에 닿는 위치를 결정한다. 샴페인 잔처럼 긴 잔으로 마실 때는 고개를 젖혀야 하기 때문에 혀 안쪽으로 와인이 떨어진다. 혀 안쪽엔 신맛과 쓴맛을 느끼는 신경이 많이 분포돼 있다. 따라서 신맛과 드라이한 맛을 강조하는 샴페인이 제격. 반면 작은 잔으로 마실 때는 와인이 혀끝에 먼저 닿는다. 혀끝엔 단맛을 감지하는 신경이 많다. 따라서 디저트 와인을 마실 때는 작은 잔이 좋다.
레드 와인은 품종에 따라 잔 모양이 다르다. 프랑스 보르도 와인의 주요 품종인 카베르네 소비뇽은 묵직한 향과 함께 입안을 조여 주는 타닌이 많다. 그래서 일반적인 와인잔이 좋다. 공기와 접촉 면이 넓어 산화가 빨리 이뤄지기 때문에 타닌이 부드러워진다. 반면 프랑스 부르고뉴에서 재배되는 피노 누아는 섬세한 포도 품종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변해 가는 향이 매혹적이다. 그래서 피노 누아 와인은 향을 모아주는 둥근 스타일의 잔이 제격이다.
화이트 와인을 마실 땐 볼이 좁고 용량이 적은 잔을 사용하는 게 적당하다. 좁은 볼은 공기와 접촉 면을 줄여 화이트 와인의 산도를 유지해 준다.
와인의 맛은 잔의 모양뿐 잔의 품질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와인을 소재로 다룬 영화 ‘사이드웨이’에서 주인공은 전 부인의 결혼식에 다녀온 뒤 자신이 가장 아껴두던 와인 ‘슈발블랑 61년산’을 꺼낸다. 슈발블랑은 보르도 생테밀리옹의 최고급 와인. 더구나 61년산은 20세기 최고의 보르도 와인이 생산된 해다. 그런데 그가 와인을 들고 간 곳은 다름 아닌 패스트푸드점. 그는 이곳에서 햄버거를 안주 삼아 콜라를 담는 종이컵에 슈발블랑 61년산을 따라 벌컥벌컥 마신다. 홍대 앞에서 와인바를 운영하는 우서환 사장은 “주인공의 비참한 심정이 가슴 절절히 전해졌다”고 말했다.
실제 와인을 마실 때 종이컵이나 맥주잔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게 바람직하다. 와인의 향을 잘 모아주는 튤립 형이 좋다. 물론 튤립 형태의 와인잔도 2000원짜리 플라스틱 잔부터 10만원대의 크리스털 잔까지 다양하다.
좋은 잔은 입을 대는 가장자리(rim)가 상당히 얇다. 림이 얇으면 얇을수록 입술을 댈 때 느낌이 부드럽다.
세계적인 와인글라스 회사 리델 창업주의 11대손인 막시밀리안 리델은 올 초 한국을 찾아 “입술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한 물질이 접촉될 경우 머릿속에서 그 느낌이 가장 먼저 각인돼 그 안에 담긴 맛을 느끼기 힘들다”며 “와인잔 테두리는 키스를 할 때처럼 잔의 첫인상을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무게도 가벼울수록 좋다. 와인 향을 느끼기 위해 잔을 돌릴 때 무게감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와인을 따를 때는 잔의 3분의 1만큼 따라주는 것이 예의다. 좋은 와인일수록 투명도도 높다. 와인의 향만큼이나 와인의 색깔과 투명도도 중요한 요소다.
디자인 역시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와인잔은 남다른 S라인으로 종종 여배우와 비교될 때가 많다. 전 세계 출시된 와인잔 중 가장 볼이 넓은 리델의 소믈리에 시리즈 부르고뉴 그랑크뤼 잔은 와인업계의 마릴린 몬로로 통한다. 날씬한 라인을 자랑하는 독일산 쇼트즈위젤은 오드리 햅번을 본뜬 ‘오드리’ 라인을 선보이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잔은 ‘셰프 앤드 소믈리에’(Chef&Sommelier)라는 잔이다. 각진 스타일에 콱스(kwark)라는 신소재를 사용해 잘 깨지지 않는 것이 강점이다.
고급 와인을 마실 경우 좋은 잔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보르도 최고급 와인의 하나인 샤토 라투르와 함께 리델의 보르도 소믈리에 잔을 내놓아 주목받았다. 우서환 사장은 “비록 독재자이지만 와인만큼은 잘 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돌이켰다.
와인잔과 관련해 한국인들이 지나치게 격식을 따진다는 목소리도 높다. 대유와인의 이경희 대표는 “프랑스에 가면 한국과 달리 와인을 마시는 사람 중 80% 이상이 잔의 볼을 쥐고 마신다”며 “한국인이 더 격식을 따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뉴욕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와인잔 중 하나가 리델의 ‘다리 없는 잔’(stemless glass)이다. 일반 와인 잔에 비해 공간 활용도가 높고 깨질 가능성이 작아 인기를 끌고 있다.
|
|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